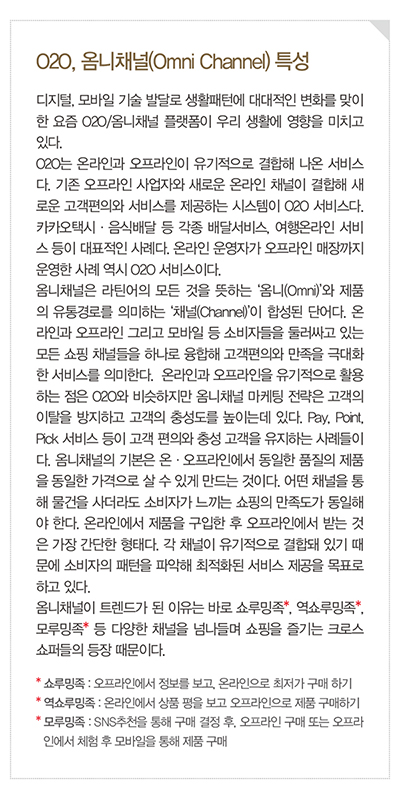패션, 온라인 퍼스트 아직도…
“국내 전자상거래 20년 역사 동안 패션 카테고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마켓 지배력과 자금력을 지닌 제도권 패션 회사들이 온라인 판매를 이월상품의 재고현금화에 주로 사용했고, 온라인 벤더회사 역시 가격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월상품에만 집중했다. 전국적으로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에 달하는 위탁판매 형태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진일보를 거듭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패션산업의 e커머스 분야는 제자리걸음 또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이미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는 시공과 국경을 초월하며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데 말이다.”
O2O(Online to Offline) 전략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응환 씨를 비롯해 온라인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제도권 패션기업들이 e커머스의 거대한 성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심지어 역행했다고 평가한다.
과거 30년 동안 백화점과 대리점 유통채널의 확장과 더불어 호시절을 보냈던 제도권 패션기업들은 최근 4~5년 동안 온라인과 모바일에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다. 지난 2016년에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백화점의 연간 매출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패션 e커머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을 반전시킬 묘수는 없는 것일까? 제도권 패션기업들의 유통채널 전략을 e커머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마인드를 리셋해야 한다. 특히 밀레니얼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들은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 소비를 주도하는 이들은 쇼핑의 시공간 제약을 허무는 O2O, 옴니채널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소비자의 패턴을 파악해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 소비자들은 확 바뀌었는데 제도권 패션기업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굼뜨고 있는 형국이다.
패션업계가 온 • 오프를 넘나드는 쇼핑 패턴인 O2O, 옴니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바로 통일된 가격정책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고객이 분명하게 구분됐다. 그러나 지금은 온 •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가격을 실시간 비교하면서 소비한다. 그럼에도 국내 패션 브랜드들은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 버젓이 이중가격이 존재한다.
원인은 무엇일까?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자체 온라인몰을 비롯해 해당 유통점과 연결돼 있는 오픈마켓의 온라인몰에서 브랜드 본사 또는 매장 매니저와 상의도 없이 주말에 할인쿠폰을 붙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브랜드 본사도 모르게 들쭉날쭉한 가격정책으로 공들여 구축한 브랜드 신뢰만 망가지기 일쑤다.
옴니채널 활성화? 온 • 오프 통일된 가격정책 시급
백화점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철수 등 강경대응이 필요하지만 갈수록 e커머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 온라인몰의 철수는 결국 오프라인 매장 철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도 백화점 파워는 한국 패션유통 시장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결국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중가격 생성을 최소화하고, 자사몰을 키우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자라」 「유니클로」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일관된 온 • 오프 가격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시즌오프를 진행하는 「자라」와 아이템별 반짝세일을 진행하는 「유니클로」이지만, 두 브랜드 모두 온 • 오프에서 통일된 가격정책으로 O2O, 옴니채널 서비스가 이뤄졌다.
온라인 전용 상품의 개발도 국내 패션업계가 시도할 만한 해법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패션기업들이 가져온 가격정책은 오프라인 우선이다 보니 원가의 4~7배수로 판매가를 책정해 왔다. 백화점의 높은 유통수수료와 판매관리비를 고려하면 이 정도 마크업은 해야지만 그나마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이다.
온라인 전용상품 개발, 옴니 구현 해법으로!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잘되는 제품은 원가에 평균 2~3배수 정도로 책정해서 가격경쟁력을 갖췄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 「스타일난다」 「난닝구」 「임블리」 「로미스토리」 등 온라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패션 브랜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결국 패션회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용 상품을 따로 준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유통채널별 상품을 달리 준비하거나 소비자 구매성향이 워낙 빠르게 나타나는 만큼 이곳에서 마켓 테스트를 거친 뒤 오프라인 유통으로 확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국내 제도권의 온라인몰에서 신상품 매출이 나오는 브랜드는 특정 복종의 리딩 브랜드, 패션 대기업의 인지도 높은 브랜드, 매스티지급 이상으로 포지셔닝된 브랜드들이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기에 비싼 가격대임에도 온라인에서 신상품이 팔려 나간다.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가격 소구형의 무조건 싼 제품이 아니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이다.
밀레니얼 소비자, e커머스 흡수 속도 빨라
국내 패션기업 중 e커머스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자금력과 우수 인재를 확보한 패션 대기업들이다. LF(대표 오규식)의 LF몰(www.lfmall.co.kr) 삼성물산(패션총괄 박철규)의 SSF샵(www.ssfshop.com) 등 일부 패션 대기업 중심으로 자사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섬(대표 김형종)의 더한섬닷컴(www.theHandsome.com)과 신원(대표 박정주)의 신원몰(www.Shinwonmall.com)은 자사몰 특성을 살려 가며 e커머스를 키워 가고 있다. 최근 신성통상(대표 염태순)도 탑텐몰(www.top10mall.com)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브랜드 중심으로 e커머스를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 곳은 이랜드월드(대표 정수정)를 손꼽을 수 있다. 이 회사는 패션 제조 • 유통 일괄(SPA) 브랜드 「스파오」와 슈즈 SPA 브랜드 「슈펜」을 지난해 9월과 4월부터 각각 O2O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브랜드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고 일부 온라인 전용 제품을 매장에서 살 수도 있다.
제도권 패션기업들 움직임 “너무 굼뜨다”
앞서 이랜드는 O2O 시스템을 개발해 중국에서 먼저 도입했다.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재고를 파악해 배송하는 O2O 애플리케이션을 2015년 말 개발했고 2016년 이를 도입했다. 당시 중국 내 이랜드의 오프라인 매장들의 25%인 2000여개 매장이 광군제 행사기간에 참여하며 전년 대비 157% 증가한 실적을 내기도 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중국에서 O2O 서비스를 2016년 처음 선보이고 지난해 업데이트해 본격적으로 선보이며 광군제 등에서 실적이 많이 늘었다”며 “이제 이를 국내에도 도입해 확산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이랜드그룹은 이랜드몰(www.elandmall.com)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내 패션유통 채널의 한 획을 그은 대리점과 아울렛 업태를 처음으로 개발해 선보였던 만큼 온라인몰에 대해서도 후발주자로 참여했지만 자사몰을 뛰어넘어 뭔가 획기적인 플랫폼을 선보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크다.